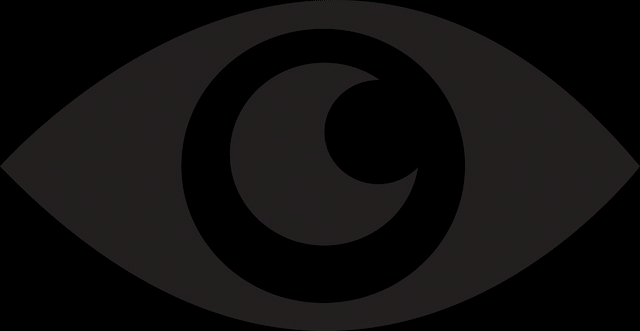(일본번역괴담) 지워지지 않는 칠판 글씨

고등학교 2학년이던 그 해 여름, 우리 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3층의 과학실을 사용하던 2학년 사이에서만 떠돌던 소문이다.
그 과학실에서는 작년에 실험 중 큰 사고가 나서 한 학생이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 후로 그 과학실은 한 번 폐쇄되어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작년 말에 병원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소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사고가 있던 날에 쓰였다는 칠판의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아무리 닦아도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그 글씨가 칠판에 나타난다고 한다.
그것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경고의 말이었다.
소문을 들은 나와 친구들은 호기심에 밤에 몰래 들어가 그 과학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과학실 문을 열자 수업이 끝난 후 그대로 남아 있는 듯한 책상, 의자, 그리고 칠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칠판에는 또렷하게 그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문의 글씨를 보고 놀라서 웅성거리는 한편 어쩐지 조금 긴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무리에는 나서기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법이다.
한 명이 용감하게 그 글씨를 지우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 친구에게 집중되었다.
과학실 전체에 무거운 긴장이 내려앉고, 공기가 차가워지는 기분이었다.
그 친구는 칠 지우개를 들고 가만히 서 있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고, 앞으로 나섰던 친구가 작게 말했다.
"손, 손이... 아, 안 움직여...... 누가... 누가 뒤에서 나 잡고 있어?"
그 순간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어느새 그 친구도 밖으로 나와 덜덜 떨고 있었다.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 게 아니었다.
지울 수 없는 거였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과학실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학교 측에서도 그 과학실의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아예 못질을 해서 문을 영구히 닫아버렸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칠판의 글씨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밤이 되면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더해져서 말이다.
'일본 괴담 번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ch/5ch] 괴담 - 귀신 그네 (0) | 2023.11.13 |
|---|---|
| [2ch/5ch] 익명 토론방 - 이웃집 소리 (2) | 2023.11.09 |
| [2ch/5ch] 702: 알 수 없는 현상 토론방 (0) | 2023.10.30 |
| [2ch/5ch괴담] 774: 애니메이션 & 게임 토론방 2022.03.16 기록 (0) | 2023.10.19 |
| (일본 번역 괴담) 떨어지는 그림자 (2) |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