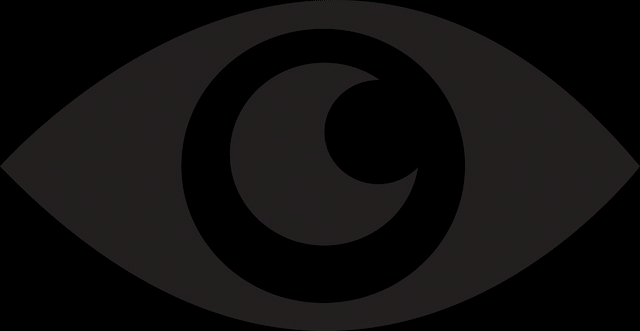(괴담창고) 동생의 입버릇

동생이 죽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동생마저 죽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과 보험금으로 살 집을 마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작지만 여자 둘이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집이었다.
힘들지만 그래도 살았다.
슬퍼도 살았다.
그런데 이제 좀 잊고 살만 해지니까 동생이 부모님 곁으로 갔다.
급사? 과로사?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건 동생에게 병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동생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아니 다들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동생은 어지럽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툭하면 어지럽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것치고는 너무 건강한 모습이라서.
힘든 일도 척척해내고 쉴 때 쉬는 요령 있는 아이라서.
다들 그저 엄살인 줄 알았다.
병원에서도 간단한 약 몇 가지만 처방해 주었다.
빈혈약이라거나 영양제 정도였다.
아마도 흔한 증상이라 대충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준 것이 분명했다.
의사라는 사람들은 항상 그랬다.
예전부터 부모님도 어지럽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동생도 어지럽다는 말을 했다.
다들 동생이 부모님을 보고 배웠다며 웃었다.
이제 그 말조차 들을 수 없게 됐다.
“어지러워.”
문득 귓가에 그런 중얼거림이 들렸다.
집에는 이제 혼자였고 그 말을 할 사람은 없었다.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다.
환청일까? 착각일까?
아니면 혹시……
그날 이후 종종 어지럽다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집에 있을 때만 가끔 한 번씩이었다.
이 속삭임은 진짜일까?
그냥 착각일 뿐일까?
녹음을 해보기로 했다.
주말 하루 동안 아침부터 녹음기를 켜두고 지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재생해 보았다.
10시간이 넘는 길이를 다 들어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초조한 마음에 잠도 오지 않았다.
천이 스치는 소리, 발소리,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말 한마디 없이 생활 소음만 들려왔다.
소리만 들어도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하나하나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쩐지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착각이었나 싶은 안도와 함께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다.
아직 녹음된 것이 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풀어지고,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다.
“어지럽네.”
막 잠들려는 순간 그 말이 들렸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평소에 동생이 입에 달고 살던 말.
부모님에게 배운 것인지 툭하면 던지던 그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녹음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당혹스러웠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조금 지나자 약간 다른, 약간 길어진 말이 나왔다.
이런 말은 처음 듣는 것이었다.
당혹스러움이 더 심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바로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 건가?”
평소에 동생이 자주 하던 말들.
그 입버릇이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상하잖아.”
이 집에 아직 있었던 것일까?
떠나지 못하고 쭉 머물고 있던 것일까?
“왜 언니는 어지럽지 않아?”
조금 눈치채고 있었구나?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예정보다는 빠르지만 얼른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괴담 공작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괴담창고) 그녀의 그림 (0) | 2022.04.20 |
|---|---|
| (괴담창고) 그날을 기억해 주세요 (0) | 2022.04.18 |
| (괴담창고) 구멍가게의 구석 (0) | 2022.04.11 |
| (괴담창고) 지난날의 과오 (0) | 2022.04.06 |
| (괴담창고) 컵라면 두 개 (0) | 2022.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