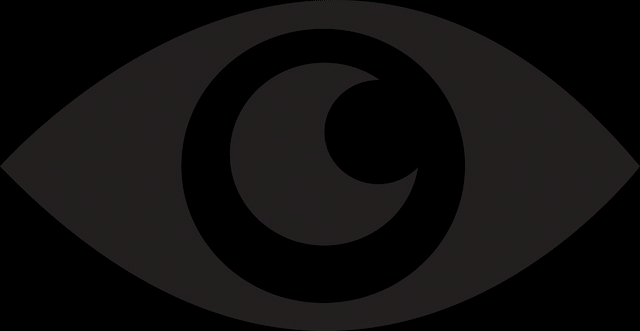(괴담창고) 지난날의 과오

그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다.
살려달라는 힘없는 외침과 절박한 표정, 피가 엉긴 손, 꺼져가는 눈동자.
천천히 죽어가는 그 여자를 끝까지 지켜보며 있었던 자신.
그 모습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자연히 생활은 엉망이 되었고, 툭하면 잠에서 깨기 십상이었다.
고통의 나날.
이런 삶을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살인자에게 어울리는 그런 삶이었다.
하지만 참았다.
고통스럽지만 그 이상으로 두려웠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는 성당을 찾았다.
이제 그만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자신의 죄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의 죄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저는……”
[......]
“저는, 그……”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언제든 형제님을 용서하십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것도…… 성모마리아가 보시는 곳에서……”
[...... 사람을요?]
“네…… 제 눈앞에서…… 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 그 손, 그 얼굴, 그 목소리… 잠을 자면 꿈에서도 그 모습을 봅니다.”
“성모님의 벌인 것이 아닌가 하고……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후우…… 벌써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지요.”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만히 있었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는 않았나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섭습니다.”
“혹시 누가 또 그걸 보지는 않았을까,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아닐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은 없었나요?]
“......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서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누가 찌른 것인지는 보셨나요?]
“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누가 걸어가는 소리만……”
[이제라도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할 수 있어 다행이군요.]
“...... 신부님?”
그는 벽 너머에서 신부가 일어나는 소리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저벅
저벅
저벅
그날 들었던 발소리였다.
'괴담 공작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괴담창고) 동생의 입버릇 (0) | 2022.04.14 |
|---|---|
| (괴담창고) 구멍가게의 구석 (0) | 2022.04.11 |
| (괴담창고) 컵라면 두 개 (0) | 2022.04.04 |
| (괴담창고) 계속 생기는 물웅덩이 (0) | 2022.03.29 |
| (괴담창고) 마법소녀 리-제네레이션 (0) | 2022.03.28 |